이혼 자녀의 상속권에 대해 알아야 할 핵심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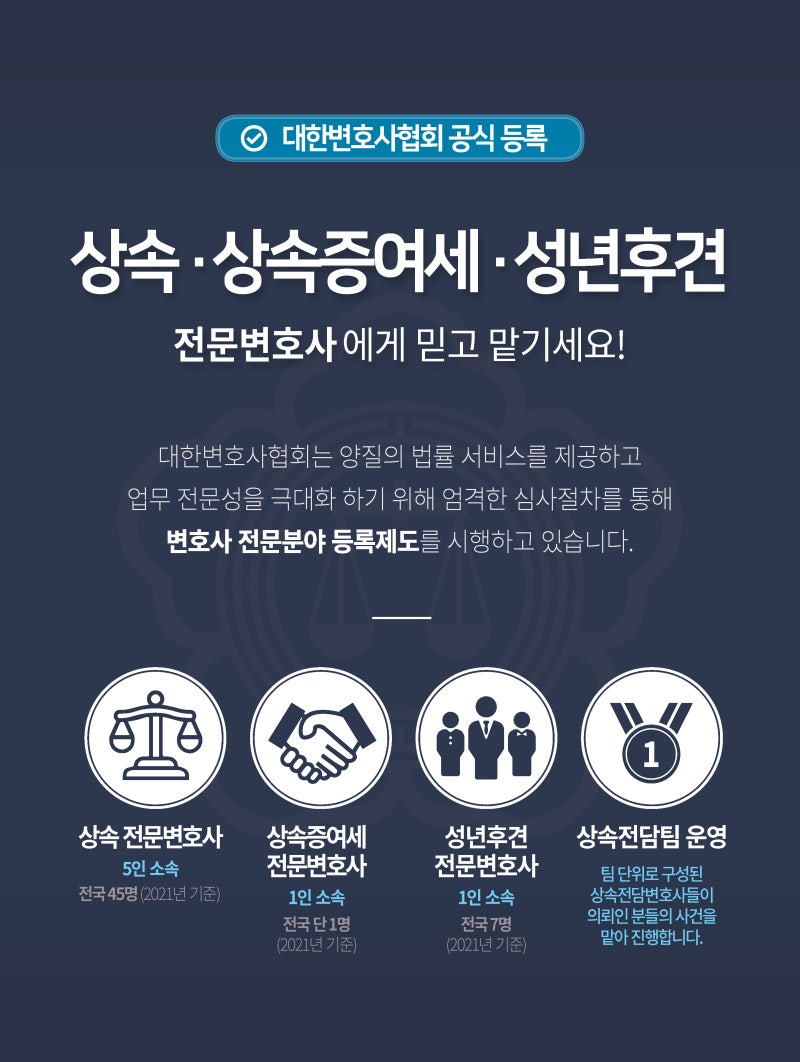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아무리 큰 싸움이라도 쉽게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어느 정도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이혼이 발생하면 부부관계는 영원히 끝나게 됩니다. 부부는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에서 인정하는 부양의무도 없고 상속권도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 후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었던 배우자가 상대방의 불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아직 이혼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생존배우자가 모든 상속권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혼 여부에 따라 상속권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혈연관계는 이혼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배우자와 이혼하더라도 자녀는 친자녀이므로 상속권은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는 자녀를 키우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이혼 자녀에 대한 상속권도 인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혼 후 재혼하더라도 전 배우자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상속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혼하고 재혼하더라도 부모와 자녀가 혈연관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상속자로서의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결론은 우리나라 민법이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상속인의 지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순으로 인정되며, 배우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혈연관계라고 합니다. 즉, 혈연관계가 없으면 상속권도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양자나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실제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상속권은 인정된다고 했다. 입양아의 경우 법적으로 친자녀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입양아와 친양자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친부모와의 관계가 끝나느냐 아니냐입니다. 입양아의 상속권은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에게 인정되지만, 친부모에 대한 친부모의 상속권은 소멸된다고 합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재혼하여 자신의 자녀가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이 입양자녀에게 상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자녀의 상속에 관해서는, 이혼 후 상대방이 키우는 자녀에게 상속권을 물려주는 것을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친권을 행사하고 있는 전처나 전남편, 재혼 배우자가 귀하의 상속 재산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유언장을 통해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미리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유언장을 남기면 법적 상속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유언장을 통한 상속분배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때로는 각자가 자녀와 재혼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때 배우자와 다시 이혼할 경우 신분관계 해결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공동입양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혼인 중에 입양한 입양아는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이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수를 하면 본의 아니게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신분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혼 자녀의 상속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중요하다. 그는 상속계획을 세울 때 법적 요건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A씨는 이혼 후 혼자 아이 C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사업파트너의 직원으로서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B씨를 만났다고 한다. B씨는 이혼 후 홀로 아이 D를 키우며 두 사람이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면서 사랑에 빠져 재혼을 결심했다고도 했다. A와 B는 재혼 후, 서로의 자녀를 책임지기 위해 C와 D를 친양자녀로 입양하기로 결정했으나 그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곧 A와 B가 자주 싸우기 시작했고, B의 불륜이 발각되자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때 A씨와 B씨는 친자녀를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A씨는 헤지 이후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의 자녀 C씨는 자신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줄 알았는데 D씨의 존재가 이를 막았다고 한다. 이혼하지 않는 이상 D씨는 A씨의 자녀로 인정돼 상속권을 갖게 됐다고 한다. C씨는 남편과 이혼을 시도하더라도 A씨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고, 결국 D씨와 상속 재산을 반반 나누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재산권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정보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혼한 자녀에게 물려받은 것. 이혼 시 입양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속분배가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신분관계와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상속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혈연관계는 이혼 후에도 유지된다. 관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자녀에 대한 상속권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조언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법적 상속에 따른 상속분배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 양자나 친양자를 통한 입양이나 유언장을 통한 재산처분 등이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개인사정에 따라 재산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상속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